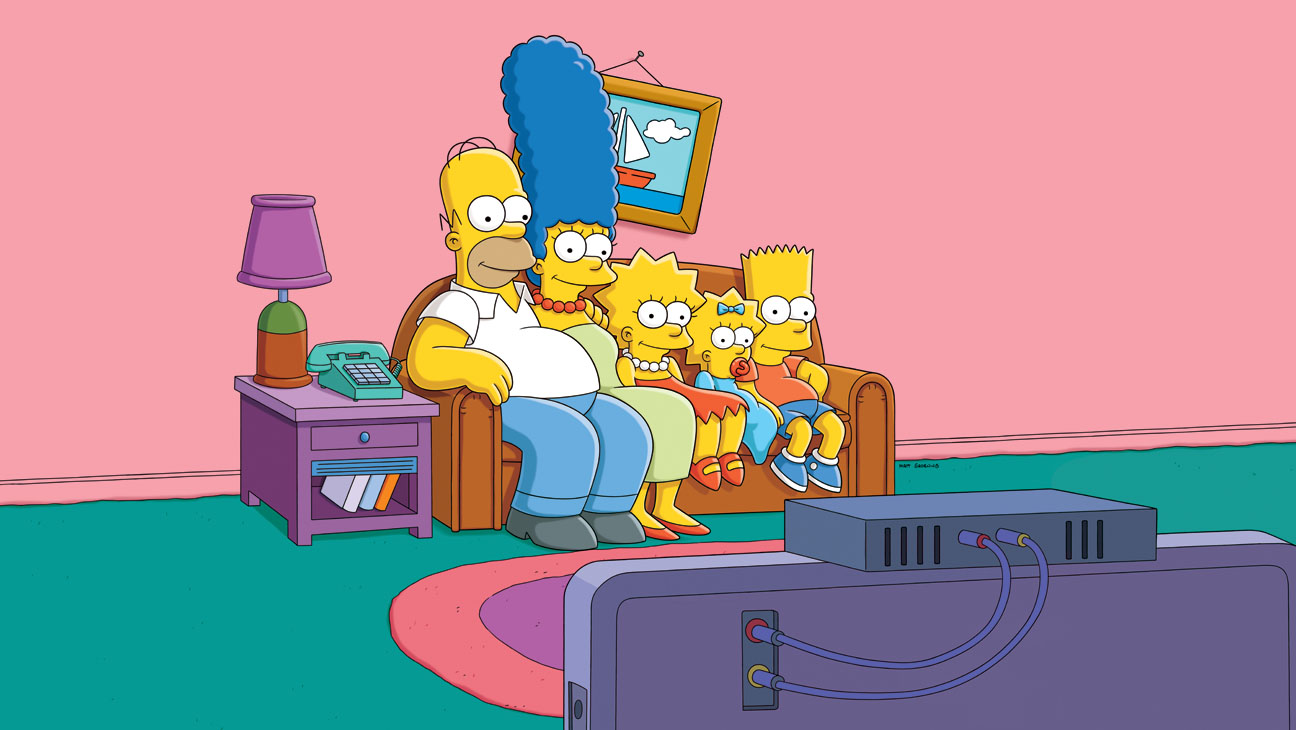The Simpsons
오늘은 제가 아주 아끼는 topic을 준비했습니다. TV 보는 것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지금도 방영되고 있는 program으로 Time Magazine 선정 20세기 최고의 TV series를 비롯, Entertainment Weekly 선정 지난 25년간 최고의 TV show, Empire지가 뽑은 역대 최고의 TV show의 자리에 올랐으며, 대중적인 인기와 전문가들의 사랑을 골고루 받아온 show인데요. 바로 매주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만화, The Simpsons입니다. 80년대말에 시작해서, 올해가 벌써 26번째 season인데요. Emmy상도 많이 탔고, 훌륭한 작품에만 주어진다는 Peabody상 역시 수상했습니다.
"Doh!"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program이니만큼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 방영되지 않았겠죠? 오늘은 이 show의 특징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prime time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저녁시간에 성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만화 program을 다시 미국 TV에 등장시킨 공이 있습니다. 이 show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그 후에 나온 South Park이라든가, Family Guy등 성인 대상 만화가 나오기도 힘들었을텐데요. 사실 The Simpsons도 초기에는 아들인 Bart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지만, 점차 아빠인 Homer에 더 관심과 주목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program을 방영하는 FOX television에서 이 show가 최초로 전체 시청률 top 30에 들기도 했고요.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webtoons을 영화화하거나 TV program으로 만드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모 cable channel에서 방송하고 있는 바둑 용어를 제목으로 한 drama가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The Simpsons 역시 만화가의 머리와 손에서 출발헸는데요. Matt Groening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바탕으로 한 거의 즉흥적인 설정이죠. 자기 이름만 Bart로 바꿨고, 부모님, 두 여동생, 친조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썼다는데요. 무대는 허구의 Springfield라는 동네인데, 50개의 주 중에서 35개의 주에 그와 비슷한 이름의 동네가 있어서 다들 이거 우리 지역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show에서 주소가 보일 때는 주 부분을 가리거나 주를 말할 때는 갑자기 소음이 나와서 들리지 않는 방법으로 정확히 어디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화이면서 sitcom이다보니 우선 웃기고 재밌어야 하겠고요. 그런데 내용이나 줄거리를 풀어가는 방법, 웃기는 방법도 특색이 있습니다. Postmodernism이라는 말을 한국에서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데요. 이 용어는 정의도 넓고 해석도 정확히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간단히 이 show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작품의 가치를 판단해서 순위를 매기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수가 아닌 복수성, 또 확실함보다는 불분명함에 촛점을 두는 경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언급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데요.
Keyword를 꼽자면 연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왔을 때, 어떤 요소가 등장했을 때, 제목이 붙었을 때, 그게 암시하는, 언급하는 게 있는데요. 연상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할아버지 Abe가 빵에 forks를 찍어서 Charlie Chaplin의 흉내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물론 Chaplin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그 장면으로 Chaplin을 나타냈던 다른 영화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것은 Chaplin의 지적재산이므로 그 행동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얼마전에 TV sitcoms의 episode 제목 종류에 대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program이야말로 종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season의 제목만 보아도 80년대의 만화책과 거기서 나온 2010년대 영화, 고대 중국의 책, 19세기 말의 유명한 미국소설, 80년대의 pop song과 영화, 60년대 counterculture의 책과 노래, 또 Shakespeare 희곡의 유명한 대사와 그것을 제목으로 쓴 미국의 문호 John Steinbeck의 소설 등에서 따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이고 제목과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도 다양했고요. 이런 references를 모르더라도 내용 자체로 충분히 웃고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다시 볼 이유가 됩니다. 만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예전 seasons의 episodes를 보아도 technique을 제외하면 작품 속의 fashion이나 style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잘 느낄 수 없고요, 역시 만화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나이를 먹지 않죠. 그래서 Bart와 Lisa는 계속 각각 4학년과 2학년이고, 막내인 Maggie는 아직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약간 콩글리시로 얘기해서 마이너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100% 반체제라거나 너무 앞서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지만, 그들을 비하하지는 않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issues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등장인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만 만든이들은 다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작가들의 1/3정도가 Harvard 학부 졸업생이어서 그런지, 작품 안에서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Mr. Burns는 Yale을 나온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Mr. Burns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등장인물들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족을 중심으로 대부분 동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그 동네 주민들의 성격이라든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episode마다 생기는 사건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되죠. 한국에서 주말에 인기가 있는 소위 real variety programs을 생각해보시면, 물론 genre는 다릅니다만, 재미와 웃음도 있지만, 출연자들에게서 느끼는 친숙함, 또 출연자 사이의 관계 역시 꾸준히 시청하는 이유겠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이 작품의 장수비결은 기발하고 웃기는 내용과 대비를 이루며 살짝 보이는 날카로운 비판, 또 기존의 문화를 이용한 postmodern 구성과 이런 문화요소를 등급을 나누거나 주류비주류로 구분하지 않는 포용성을 겉에 내세우면서 작품 안에 흐르고 있는 가족애와 인간미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작품과 다른 작품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인간미와 가족애를 오글거리지 않게 딱 균형을 맞춰서 끼워넣고 있습니다. 한 예로 Lisa가 조랑말을 갖고싶어하자 아빠가 투잡을 뛰면서 비용을 마련하는데, 나중에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아빠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엄마 Marge로부터 들은 Lisa가 아빠가 알바를 하는 편의점에 가서 이제는 조랑말을 키우지 않겠다. 나는 큰 바보 동물이 더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빠는 정말 단순한 바보라서 한숨을 쉬며 이번엔 또 뭘,이라며 사주겠다는 의미의 말을 하고, Lisa가 그게 바로 아빠다,라고 가르쳐준 후에 아빠가 Lisa에게 말이 되어 같이 놀아주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episode가 있었는데요. 따뜻하면서도 설정된 characters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행동과 대화였습니다.
이번 일요일 episode 제목은 70년대 Led Zeppelin의 노래 제목이자 90년대 영화제목인 Dazed and Confused에서 따온 “Blazed and Confused”라고 하는데요. 저도 Sunday Night Football 보기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청하시면 어떨까요?